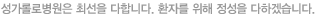그전까지는 혼자 잘 놀던 아이가 생후 6개월이 되고부터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금방 울음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다. 엄마가 집안일이든 샤워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드는 아이를 ‘엄마 껌딱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분리 불안이라고 하는데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쯤 시작해 30~36개월이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분리 불안은 왜 생기는 걸까?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아 일부러 울음을 터트리는 것이 아니다. <육아는 과학이다>의 저자이자 아동 심리치료사인 마고 선더랜드는 분리 불안에 대해 “하위뇌에 위치한 분리 불안체계는 유전적으로 예민하게 작동해 아기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 울음으로 자신의 행방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이의 전두엽(상위뇌)이 발달하면서 점차 억제되고 말을 하게 되면 점차 엄마와 떨어져도 잘 지낸다.
하지만 생후 6개월에 아이를 혼자 두면 공포를 느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또한 엄마를 찾으며 슬퍼하면 신체 통증을 느낄 때와 같은 뇌 부분이 활성화한다. 그 결과 두려움 체계가 과민하게 굳어져 공포증, 편집증, 회피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 신체 접촉하기 아이가 울 때는 신체접촉을 한다. 아이를 안거나 마사지를 하면 아이의 신체 각성 체계가 조절되어 평온하고 차분한 신경계가 활성화하고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외출할 때는 엄마나 아빠의 피부, 체온,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수 있게 아기 띠, 포대기 등을 사용해 직접 안아주자. △ 엄마를 따라다니게 두기
아이가 엄마가 안 보이는 환경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거나 하면 안 된다. 또한 이때는 아이의 언어중추가 아직 작동하지 않으므로 “곧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도 소용이 없다. 이때의 아이는 기어 다니기 때문에 어디든 엄마를 따라다니게 하는 것이 좋다. △ 아빠와 유대관계 미리 형성하기
생후 6개월엔 아이가 부모와 낯선 사람을 구분한다. 그런데 아빠마저 낯선 사람이 되면 엄마 혼자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아빠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매일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헤서 유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이의 표정을 똑같이 흉내 내거나 작은 소리를 낼 때 다정한 목소리로 반응하고 아이의 눈을 지그시 맞추는 등 흉내 내기 놀이를 함께 한다. 아빠 특유의 낮은 목소리로 우는 아이를 달래주는 것도 좋다. 
6개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아이와의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분석가 이승욱은 자신의 책 <천 일의 눈맞춤>에서 “양육을 양가 부모님 혹은 육아 도우미에게 의지해야 한다면 낮 시간의 양육자와 퇴근 후 부모의 양육 방식이 가능한 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 때 달래기, 수유, 기저귀 갈기 등과 같은 육아 방식에 대해 의논해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
|